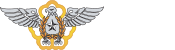커뮤니티
군대이야기
"북파"<21>군용열차와두여대생
김**
|Views 681
|2005.06.17
------------
군용 열차에서 만난 두 여대생
공군예비역 인터넷 동호회의 ‘정보부대인의 방’을 열면 첩보부대와 실미도 부대 마크 베너가 뜬다. 공군 신사들이 보면 섬뜩한 해골과 칼, 그리고 낙하산 윙……. 이 창을 열 때마다 나는 먼 옛날 깡패중대 김 상사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 시절 고향이 그리우면 남들은 권총 하나 차는 것도 어려울 때 두 개씩이나 차고 고향으로 내려가 한바탕 폼을 잡고 돌아오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낯간지러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당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기차로서, 민간 객차에는 두 개의 군용 객차가 달려 있었다. 콩나물 시루처럼 붐비는 객차에 육군수송 승무헌병과 열차수송 승무상사들이 합동근무를 할 때였다. 그 시대에는 이들의 위세가 대단했으며 그곳에 근무했다 하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말하던 좋은 보직이었다.
군용 열차를 회상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 그날도 군용 열차에는 휴가 나온 장병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열차 복도를 비집고 들어가 선반 위에 얹어 놓은 군용 가방들을 확 쓸어 버렸다.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군인들이 ‘웬 날벼락이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계급장 없이 옆구리에 찬 권총 때문인지 모두 놀라 “어……, 어?” 하면서 말은 못하고 사태를 주시하기만 했다.
나는 윗도리를 확 벗어 던졌다. 당시 나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앞에는 낙하산을 바탕으로 비스듬히 꽂혀 있는 두 개의 칼, 그 위에 해골 마크가 그려 있었다. 게다가 007영화의 주인공 숀 코네리처럼 왼팔 겨드랑이에 또 한자루의 권총을 차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성큼성큼 장병들의 머리통을 마구 짓밟으면서 의자를 딛고 비워진 짐 얹어 놓는 선반 위로 기어올라갔다.
“어? 내 오른 발목 워커 구두 옆에는 시퍼런 단도가 꽂혀 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군용칸 장병들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기차는 출발했고, 나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잤는데,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휴가증을 보자고 했다. 헌병들과 수송 승무원들이 승객 장병들 증명서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야, 왜 잠자는데 깨우는 거야?”
“증명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곳은 짐을 얹어 놓는 곳입니다.”
“야, 임마. 빨리 꺼지지 못해! 잠 좀 자자.”
모든 장병들이 토끼눈을 하고 선반 위에 누워 있는 나를 주시했다. 밑에 있던 승무헌병팀들도 화가 난 모양이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빨리 내려오라고 고함을 쳐댔다. 그렇다고 기 죽을 내가 아니었다.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
“왜 이래? 잠 좀 자자. 응? 이 자슥들아. 나 이북에 갔다 오느라고 잠한숨 못자서 그래…….”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특수부대 해골 마크, 옆구리와 허리춤에 있는 권총, 워커 구두 옆에 꽂혀 있는 시퍼런 단도……. 순식간에 수송헌병팀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푹 쉬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면 불러 주십시오.”
밑에 있던 토끼눈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서인지 아예 나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중간지점쯤 왔을까. 선반에서 기어내려와 문 쪽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수송헌병석에 여대생 두 명이 기대앉아 자고 있고, 전방에서 나온 듯한 대위 한 명이 복잡한 복도에서 서서 가고 있었다. 나는 은근히 화가 났다. 여기는 군인 전용 객차인데 민간인 여대생이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전방에서 수고하다 나오는 장교가 왜 서서 가야 하는지? 마침 수송헌병들은 다른 객차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뭐야? 야! 너희들 일어서서 나와, 장교님 이리 앉으십시오.”
여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안동까지 여행을 가는 중이었다. 일반 객차가 너무 복잡해 복도에 서서 가는 것을 보고 수송헌병들이 여기 앉혀 주었다고 했다. 그러니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는 또 이성을 잃고 말았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야단법석을 떨었더니 잠자던 장병들 모두 깨어 오들오들 떨고 여대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수송헌병, 철도수송 승무대원들이 싹싹 빌고 난장판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대위님을 그 자리에 앉혀 드렸더니 갑자기 박수 갈채가 터지고, 여대생들은 엉엉 울면서 민간 객차로 쫓겨갔다.
먼동이 트는 새벽 안동역에 내렸더니 역 개찰구 앞에서 망신을 주며 쫓아냈던 여대생 두 사람과 맞닥뜨렸다. 밤새도록 콩나물 시루 같은 객차 복도에서 서서 오느라 핼쓱해진 그녀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녀들은 내게 다가오더니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녀들이 하는 말이, 일생에 그런 망신을 당해 보기도 처음이고 그런 용감한 군인을 만나 보기도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니 이름과 주소와 부대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북을 넘나드는 특수부대 출신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르쳐 줄 수 없노라고 했다. 그렇게 아쉽게 이별을 고해서인지 중앙선 기차를 탈 때마다 그녀들 생각이 난다.
지금쯤 할머니가 되었을 그들도 기차를 탈 때마다 또는 북파요원들의 실상을 접할 때마다 해골과 칼, 낙하산이 그려 있는 티셔츠 차림의 무섭기 그지없던 어린 특수부대 요원을 떠올리고 피식 웃으며 얼굴을 붉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군용 열차에서 만난 두 여대생
공군예비역 인터넷 동호회의 ‘정보부대인의 방’을 열면 첩보부대와 실미도 부대 마크 베너가 뜬다. 공군 신사들이 보면 섬뜩한 해골과 칼, 그리고 낙하산 윙……. 이 창을 열 때마다 나는 먼 옛날 깡패중대 김 상사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 시절 고향이 그리우면 남들은 권총 하나 차는 것도 어려울 때 두 개씩이나 차고 고향으로 내려가 한바탕 폼을 잡고 돌아오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낯간지러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당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기차로서, 민간 객차에는 두 개의 군용 객차가 달려 있었다. 콩나물 시루처럼 붐비는 객차에 육군수송 승무헌병과 열차수송 승무상사들이 합동근무를 할 때였다. 그 시대에는 이들의 위세가 대단했으며 그곳에 근무했다 하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말하던 좋은 보직이었다.
군용 열차를 회상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 그날도 군용 열차에는 휴가 나온 장병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열차 복도를 비집고 들어가 선반 위에 얹어 놓은 군용 가방들을 확 쓸어 버렸다.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군인들이 ‘웬 날벼락이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계급장 없이 옆구리에 찬 권총 때문인지 모두 놀라 “어……, 어?” 하면서 말은 못하고 사태를 주시하기만 했다.
나는 윗도리를 확 벗어 던졌다. 당시 나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앞에는 낙하산을 바탕으로 비스듬히 꽂혀 있는 두 개의 칼, 그 위에 해골 마크가 그려 있었다. 게다가 007영화의 주인공 숀 코네리처럼 왼팔 겨드랑이에 또 한자루의 권총을 차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성큼성큼 장병들의 머리통을 마구 짓밟으면서 의자를 딛고 비워진 짐 얹어 놓는 선반 위로 기어올라갔다.
“어? 내 오른 발목 워커 구두 옆에는 시퍼런 단도가 꽂혀 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군용칸 장병들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기차는 출발했고, 나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잤는데,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휴가증을 보자고 했다. 헌병들과 수송 승무원들이 승객 장병들 증명서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야, 왜 잠자는데 깨우는 거야?”
“증명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곳은 짐을 얹어 놓는 곳입니다.”
“야, 임마. 빨리 꺼지지 못해! 잠 좀 자자.”
모든 장병들이 토끼눈을 하고 선반 위에 누워 있는 나를 주시했다. 밑에 있던 승무헌병팀들도 화가 난 모양이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빨리 내려오라고 고함을 쳐댔다. 그렇다고 기 죽을 내가 아니었다.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
“왜 이래? 잠 좀 자자. 응? 이 자슥들아. 나 이북에 갔다 오느라고 잠한숨 못자서 그래…….”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특수부대 해골 마크, 옆구리와 허리춤에 있는 권총, 워커 구두 옆에 꽂혀 있는 시퍼런 단도……. 순식간에 수송헌병팀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푹 쉬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면 불러 주십시오.”
밑에 있던 토끼눈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서인지 아예 나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중간지점쯤 왔을까. 선반에서 기어내려와 문 쪽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수송헌병석에 여대생 두 명이 기대앉아 자고 있고, 전방에서 나온 듯한 대위 한 명이 복잡한 복도에서 서서 가고 있었다. 나는 은근히 화가 났다. 여기는 군인 전용 객차인데 민간인 여대생이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전방에서 수고하다 나오는 장교가 왜 서서 가야 하는지? 마침 수송헌병들은 다른 객차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뭐야? 야! 너희들 일어서서 나와, 장교님 이리 앉으십시오.”
여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안동까지 여행을 가는 중이었다. 일반 객차가 너무 복잡해 복도에 서서 가는 것을 보고 수송헌병들이 여기 앉혀 주었다고 했다. 그러니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는 또 이성을 잃고 말았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야단법석을 떨었더니 잠자던 장병들 모두 깨어 오들오들 떨고 여대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수송헌병, 철도수송 승무대원들이 싹싹 빌고 난장판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대위님을 그 자리에 앉혀 드렸더니 갑자기 박수 갈채가 터지고, 여대생들은 엉엉 울면서 민간 객차로 쫓겨갔다.
먼동이 트는 새벽 안동역에 내렸더니 역 개찰구 앞에서 망신을 주며 쫓아냈던 여대생 두 사람과 맞닥뜨렸다. 밤새도록 콩나물 시루 같은 객차 복도에서 서서 오느라 핼쓱해진 그녀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녀들은 내게 다가오더니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녀들이 하는 말이, 일생에 그런 망신을 당해 보기도 처음이고 그런 용감한 군인을 만나 보기도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니 이름과 주소와 부대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북을 넘나드는 특수부대 출신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르쳐 줄 수 없노라고 했다. 그렇게 아쉽게 이별을 고해서인지 중앙선 기차를 탈 때마다 그녀들 생각이 난다.
지금쯤 할머니가 되었을 그들도 기차를 탈 때마다 또는 북파요원들의 실상을 접할 때마다 해골과 칼, 낙하산이 그려 있는 티셔츠 차림의 무섭기 그지없던 어린 특수부대 요원을 떠올리고 피식 웃으며 얼굴을 붉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식밴드
공식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