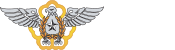커뮤니티
군대이야기
고등학교 동창들의 의리
김**
|Views 366
|2008.10.14
고등학교 동창들의 의리
오류동 공군20특무전대 정보학교 6기생으로 교육을 받은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내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는 서울에 올라와 종로 5가 뒷골목 허름한 하숙집에서 공부를 하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많았었다.
당시 하숙집은 아침저녁만 식사를 제공해 한창 먹을 나이인 동창들에게는 일요일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너무 가난한 동창들이었기에 아예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 내가 외출 나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역시 문제아 기질이 있는 내가 있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들의 배를 채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만 잘하는 그들은 너무 순진해서 내가 없으면 굶기 일쑤였다.
매주말 외출을 나가 점심때는 그래도 싼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씩이라도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일요일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일요일 외출 때는 으레 훈련생 중 당번 한 사람씩 남겨 두는데 오늘은 내가 남겠다고 자원을 했더니 모두 기뻐하며 다 외출을 나가고 혼자 내무반을 지키게 되었다.
화창한 날, 내무반에 벌렁 드러누워 있으니 기분이 영 우울했다. 점심을 굶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동창들의 눈망울이 하나하나 지나갔다. 흡사 어린 참새새끼들이 엄마참새가 물어다 줄 먹이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처절한 모습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무반 벽에 일렬로 죽 걸려 있는 훈련병들의 개인 동정복 상의들이 보였다. 그 상의 속에는 밖에서는 볼 수 없으나 하의가 걸려 있다. 그러나 상의 때문에 하의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바로 이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 하의 40벌을 모두 뽑아 정보학교 뒤편 철조망 밖에 있는 장사꾼을 불러 좋은 값에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종로 5가 뒷골목 동창들의 하숙집으로 갔다.
아직도 점심을 해결 못하고 나만 기다리고 있는 동창들에게 나는 구세주였다. 얼른 국밥을 배불리 사먹이고 그날은 얼큰하게 취하도록 막걸리도 퍼마시게 했다.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던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생보다 서둘러 귀대한 나는 꾀를 썼다. 부대 정문 앞에는 대폿집이 하나 있었다. 그 대폿집 앞에서 술판을 차려 놓고 심각한 모습으로 귀대하는 동기생들을 불러 앉혔다.
“야, 술 한잔 해라.”
“야, 태원아! 웬일이냐? 미안하다, 우리끼리 나갔다 와서…….”
“아니야,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향에는 못 가고 홧김에 술이나 마시는 거야……. 아아…….”
“아,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야, 이거 군대생활이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가고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외출하고 오는 동기생들에게 술 한 잔씩 먹이고 부대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도 덩달아 건네주는 위로의 술잔에 취해 내무반에 들어왔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동기생이 소리를 질렀다.
“야! 내 동정복 바지 없어졌다.”
“뭐야?”
“내 것도.”
“내 것도.”
늘 나를 도와주던 복싱 선수 출신 A가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와…….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 짓이네. 누가 내일 남대문 시장 가서 바지만 40벌 사와! 기합 안 받으려면 내일 저녁 점호 전에 사다 걸어 둬야 한다. 이런, 제기랄!”
모두들 내가 한 짓인 줄은 알지만 술 한 잔씩 얻어 마신 죄와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심란해하는 동기생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곁눈질해 가면서 모른 체해 주었던 것이다. 그 고마운 동기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고 죄스럽기만 하다.
그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날강도같이 놀았을까? 33기 동기인 동시에 정보학교 동기생인 성학중(학구파였던 그는 제대 후 중앙기상대 예보부장을 지냈음)이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태원아, 니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놀았고 나는 땅에서 놀았잖아…….”
그는 항공병 학교에서도 33기생 견습소대장인 내 곁에 있었고 정보학교에서도 6기생 속에 같이 있었으며 첫 적지 침투에 나섰던 동해안 오호리 파견대도 같이 나갔으며 말도 파견대에서 총기난동을 부렸을 때도 같이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던 그를 45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고 있으니 참 묘한 인연인 것 같다.
 공식밴드
공식밴드